중앙SUNDAY 2019.10.05. 00:20
집단기억 못잖게 집단망각도 필요
집권세력 기억조작 시도 경계하고
일본 향한 '전략적 망각' 고려해야

기억학은 주로 역사적 집단 기억의 현재적·미래적 함의를 다룬다. 기억학은 기억을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핵심 개념으로 밀어 올렸다. 모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는 기억이 있다. 한일 갈등 해소나 남북 화해도 기억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경한 기억학 입장에 따르면, 기억 없는 역사는 없다, 역사적 기억이 사라지면 역사 자체가 사라진다.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수백만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과 민중을 동원할 수 있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세력 대결의 중심에 있는 것도 역사적 기억이다. 양대 세력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추억이 다르다. 대한민국의 건국 연도에 대해서도 기억이 다르다. 이승만·박정희·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한 기억도 다르다. 양대 세력은 또한 일제 강점기, 친일 문제, 사법·검찰 개혁, 대입 공정성 실현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양쪽 다 집단적 기억의 내용이 다르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억 전쟁’ 중이다.
좌파나 우파의 독재나 전체주의에서는 단 하나의 역사적 기억만 존재할 뿐이다. 독일 태생의 미국 정치 철학자 해나 아렌트(1906~1975)에 따르면 독재·전체주의는 개인의 기억을 허용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가적 기억 독트린만 있을 뿐이다. 반면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기억을 권장한다. 민주주의는 단일 역사 해석, 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이다.
집단적 기억의 반대말은 집단적 망각이다. 기억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망각하는 게 좋을 때가 있다. 기억과 망각 사이에도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기억·망각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억이 우세고 망각이 열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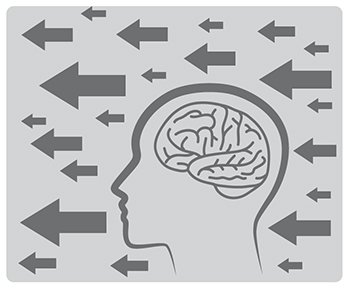
세월은 역사적 기억의 무덤이다. 역사적 기억이 지속가능하려면 기념일 지정 같은 인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외부적 자극도 필요하다. 왜 우리는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인식하게 됐을까.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위안부 관련 망언 덕분이다. 그들은 일본의 만행에 대해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우리 과거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상기시켜준다. 일본 지도층의 망언만 없었더라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죄했더라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실상 경제 식민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일본 지도층의 망언은 전형적인 소탐대실 사례다.
특히 1980년대가 위태로웠다. 그들의 망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일본의 경제력·문화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을지도 모른다. 망언 덕분에 우리는 내부 역량을 다지며 시간을 벌 수 있었다. K-팝, K-무비와 같은 한류 열풍이 힘들었을 수도 있다.
망각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원수의 죄상을 망각하고 용서할 것인가.
대북(對北) 햇볕정책은 과거사를 사실상 불문에 부쳤다. 화해와 공동번영,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일(對日)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전략적 망각’이 필요하다. 과거사 문제를 일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잊어버리는 것은 어떨까. 한일 관계가 몇 년 전 수준으로 복원돼 우리가 대마도로 관광도 많이 가고 투자도 많이 한다면, 대마도가 사실상 우리 땅이 될 수도 있다는 ‘발칙한’ 상상도 해본다.
민족국가 시대가 차츰 저물고 글로벌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민족국가의 집단기억을 차츰 글로벌 집단기억이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족과 글로벌 사이에 동아시아가 있다. 민족에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데 동아시아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면 한·중·일 중심의 동아시아 집단기억이 필요하다.
기억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망각해야 화해와 번영과 국익 수호가 가능하다. 잊어버려야 진정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많다. 최근 촛불·태극기 참가자 모두에게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한 역사의 추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환영 대기자/중앙콘텐트랩
'人文,社會科學 > 人文,社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애도의 색깔[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0) | 2019.10.10 |
|---|---|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71] 자기기만의 명수들 (0) | 2019.10.08 |
| 머리가 나쁜 것이다[동아광장/최인아] (0) | 2019.10.06 |
|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108〉낮춤의 건축미학 (0) | 2019.10.03 |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70] 불법 수호대의 등장 (0) |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