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5-8-14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 머물고 있던 영국인 친구로부터 ‘광복절’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말 그대로 의미는 ‘빛을 되찾은 날’이고, 역사적으로는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면서 그들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날이라고 설명했다. 친구는 조금 놀라면서 “어쩐지 미안한 느낌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유를 캐묻지는 않았지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감 비슷한 것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한편 빛을 되찾았다며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을 기리는 것이 그에게 낯선 일이었으리라고 짐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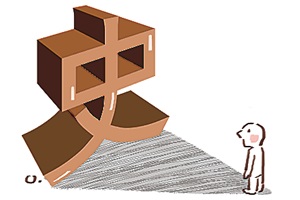
오래 전 여행을 하다가 만난 일본 청년은 나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다가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대꾸하자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무렵 나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싫어하거나 차별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나 또한 일본인 개인에게 적대감을 가진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쩌라고? 싫어하지 않을 테니 감사하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그 청년과 내가 동시에 의식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감정적 동요였다.
역사라는 것은 흘러가버린 과거다. 그럼에도 역사적 경험이 치명적인 이유는 개인의 현재 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삶의 물리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나의 부모 세대는 식민지 국민으로 살았고, 분단과 전쟁을 경험했다. 그 경험의 상흔들은 나의 세대 안에서도 감지된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자긍심이나 애정이라기보다는 열등감에 가깝고, 일제 강점기가 우리에게 근대를 가져왔다는 어이없는 주장과 그 뿌리가 같다는 느낌도 든다. 하지만 냉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다. 솔직히 나는 이민을 가고 원정출산을 감행하면서까지 국적을 바꾸고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버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집단의 기억에서 쉽게 해방될 것 같지 않지만.
부희령(소설가)
'時事論壇 > 橫設竪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선희의 시시각각] ‘성매매의 비범죄화’ 선언 (0) | 2015.08.19 |
|---|---|
| [노트북을 열며] 우리가 손잡아야 할 일본인들 (0) | 2015.08.17 |
| [일사일언] 英國 보양식, 감자 (0) | 2015.08.12 |
| [일사일언] 못된 '견' 두 마리 (0) | 2015.08.10 |
| [천자칼럼] 원폭이 없었더라면.. (0) | 201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