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6.08.11 따루 살미넨·작가 겸 방송인)
 8월의 숨막히는 더위는 너무나 싫지만 매년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다.
8월의 숨막히는 더위는 너무나 싫지만 매년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다. '여름 보양식의 왕' 민어 철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민어는 예전부터 양반 음식이라고 했다는데 알고 보니 옛날에는 흔한 음식이었다고 한다.
서해 남부는 물론이고 인천 앞바다에서까지 많이 잡혔다.
즉 옛날에는 흔히 먹는 여름 음식이었다.
내가 민어의 매력에 빠진 것은 몇 년 전 막걸리학교를 다녔을 때였다.
그때 목포에서 10㎏ 정도 되는 놈(?)을 산지 직송으로 주문해서 막걸리와 같이 먹었는데
그 이후로는 여름이 가기 전이면 꼭 민어 만찬을 벌이게 됐다.
민어 만찬은 민어 껍질튀김으로 시작한다. 바삭바삭한 껍질이 훌륭한 안줏거리가 된다.
민어 만찬은 민어 껍질튀김으로 시작한다. 바삭바삭한 껍질이 훌륭한 안줏거리가 된다.
그다음은 민어회를 음미할 차례다. 바로 잡아서 회를 쳐 먹으면 살이 물컹하고 밋밋한 맛이 나는데,
며칠 숙성을 잘 시키면 감칠맛이 깊어지고 조직감이 좋아진다.
민어뱃살회는 별미 중 별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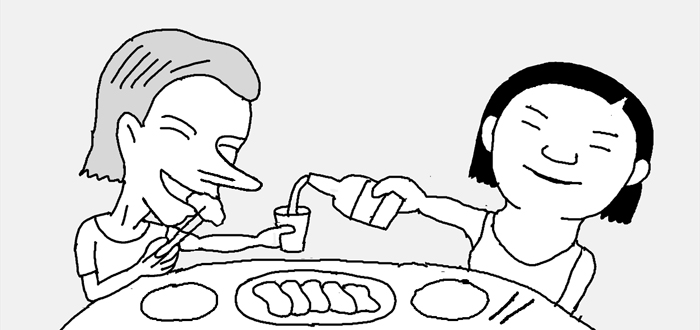
민어라면 부레를 빼놓을 수 없다. 민어 부레를 기름장에 찍어서 씹으면 처음에는 질기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나도 민어 부레를 처음 입에 넣었을 때는 이런 게 왜 맛있다고 난리인지 이해를 못 했다.
그런데 계속 씹다 보니 부레의 고소함이 입안으로 펴지면서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게 되었다.
초록색 민어 쓸개를 소주에 넣어서 먹어본 적도 있는데, 이건 맛보다는 재미 삼아 한번 먹어보기를 권한다.
민어회와 부레를 먹고 나면 민어전을 먹을 차례다. 부드러운 민어 살을 씹는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온다.
민어 만찬의 마무리는 당연히 민어탕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미나리를 듬뿍 넣은 민어 지리를 좋아한다.
전날 소주 3병을 먹었어도 민어탕 한 숟갈이면 바로 해장이 될 정도로 힘이 팍팍 난다.
민어의 단점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만만치 않은 가격이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민어인데 그 정도 가격이야 무슨 문제랴.
몸에 좋고 맛있는 걸 먹는 게 삶의 가장 큰 낙이 아닐까 생각한다.
'人文,社會科學 > 敎養·提言.思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학 끝, 행복 시작!"..기쁜 엄마vs풀죽은 아이들 사진 화제 (0) | 2016.08.13 |
|---|---|
| 아내의 옛친구가 하룻밤 묵으러 온다는 얘기에 남편 심기는… (0) | 2016.08.12 |
| 철학자는 왜 패션을 싫어할까? (0) | 2016.08.10 |
| [The New York Times] 여성이 출세해야 남성도 잘된다 (0) | 2016.08.09 |
| [일사일언] 적반하장의 기술 (0) | 2016.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