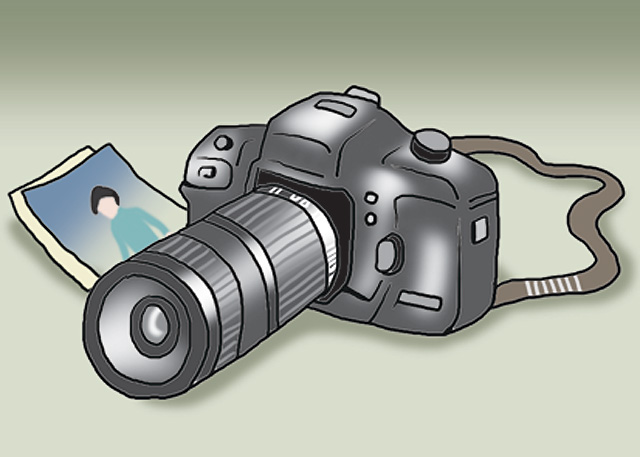

자유의 범주를 말할 때 으레 회자되는 명제가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가 자유.’ 사진 분야에 이 논리를 대입하자면, 초상권은 늘 촬영할 권리에 우선한다고 말해야 할 테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권 대다수의 국가는 초상권보다 사진가의 권리를 우선한다. 뉴욕 법원은 몇 년 전 망원 렌즈로 창 너머의 이웃들을 촬영해온 사진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사진은 현대 예술의 주요 분과이자, 그 다큐멘터리적 속성으로 인해 사회를 이해하는 사료(史料)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사진가의 시선을 다음 세대에 공유해야 한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고, 사진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얼굴’을 갖지 못할 것이다.” 프랑스 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권을 강화하려 했던 전 문화장관 오렐리 필리페티의 말이다.
오해 마시길. 타인을 멋대로 촬영할 권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외려 이 칼럼은 자중을 권하기 위해 썼다. 당신이 누군가를 찍을 때 그것은 착취가 아니어야 하며, 가급적 예술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사진가의 손을 들어주는 대부분의 근거는 작품의 ‘의도’다. 법적 분쟁의 쟁점으로 삼기에 다소 모호한 요소일 수 있겠으나, 좀 더 선명한 근거를 세우려 할 때 얼버무려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절한 윤리 기준을 세우고 공유하는 일일 터. 그러나 카메라의 보편화, 일상화의 속도에 비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력이 충분한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간혹 양 작가의 이야기를 곱씹는다. 하얀 눈밭 위 반파된 택시, 운전대에 낭자한 기사의 피, 풍선껌 두 통 분량의 짜릿한 달콤함. ‘간혹’이란 주로 나 자신이 이국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인할 때다. “이 사진은 누군가의 삶을 훔친, 그러나 껌의 단물처럼 금세 휘발되고 마는 피상적 아름다움은 아닌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순간 성실히 자문하지 않으면 사진은 어느새 ‘사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 여행을 떠날 때마다 다짐한다. 예쁜 사진을 찍되 무엇도 착취하지 않겠노라. 사진이라는 매체의 속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불가능할 소망일 터. 다만 오직 결연한 다짐만이, 우리의 섣부른 사진을 구제할 따름이다.
오성윤 잡지 에디터
'文學,藝術 > 사진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진이 있는 아침] 중국을 바꾼 소녀의 눈빛 (0) | 2019.08.31 |
|---|---|
| [조용철의 마음 풍경] 눈물 뚝뚝 백일홍 배롱나무 (0) | 2019.08.30 |
| [조용철의 마음 풍경] 해방의 함성 (0) | 2019.08.27 |
| [WIDE SHOT] 한나절 일생, 노란망태버섯 (0) | 2019.08.25 |
| [WIDE SHOT ] 절집에 배롱나무가 많은 까닭은 (0) | 2019.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