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6.11.11 윤성은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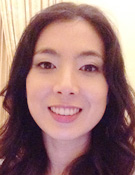 막내 작은아버지가 발작으로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이다.
막내 작은아버지가 발작으로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이다.
의식이 없어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뇌염이 심하고 기관지도 안 좋단다.
그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의 입과 팔에 마비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족 모두 혼비백산, 초긴장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는다.
작은아버지도 안타깝지만, 할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계속 간지럽다.
1928년생인 할머니는 사남매를 낳으셨는데 맏이였던 아버지는 간암으로 내가 열다섯 살 때 돌아가셨고,
대학 때는 고모와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는 작은아버지 또한 가족력을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나셨다.
하나 남은 아들만큼은 앞세우지 않으려 할머니가 갑자기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
아무도 할머니께 작은아버지의 병세를 알리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란 놀랍지 않은가.
할머니와 나눈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더니, 이 모자란 손녀의 머릿속엔 노인들의 고통을 담은 영화 몇 편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난달 개봉한 '죽여주는 여자'는 노인들을 상대로 매춘하는, 일명 '박카스 할머니'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생계 때문에 거리로 나간 소영은 한 병든 노인의 죽음을 도와주게 되고 이후 비슷한 의뢰가 이어진다.
말 그대로 '죽여주는 여자'가 된 소영 이야기는 꽤 충격적인데도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12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일사일언] 우리 할머니](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611/11/2016111100057_1.jpg)
20년이라는 나이 차에도 우리 할머니와 소영이 겹쳐지는 건 기구한 운명이라는 점 외에 어르신들의 인생에 다 같이
우리의 지난했던 근현대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단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은 위태한
사회의 변두리에서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는 풍요에 등을 대주었던 분들이다.
그 세월의 묵묵함과 고달픔이 서글픈데 인생의 뒤안길마저 외로워 보여 마음이 아리다.
할머니에게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까.
늙음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건 무리일까.
할머니 면회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人文,社會科學 > 敎養·提言.思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사일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0) | 2016.11.15 |
|---|---|
| [사이언스 토크] 집단지성과 선택 (0) | 2016.11.11 |
| "내 아이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0) | 2016.11.10 |
| 한국 상륙한 '졸혼'에 여성들이 더 솔깃? (0) | 2016.11.09 |
| [길섶에서] 가을 바보/황수정 논설위원 (0) | 2016.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