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11.07 한현우 논설위원)
우리나라 교수가 외국인 학생 조교를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여자 친구를 인사시키기에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했다.
교수는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인데 결혼은 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조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다. "저의 부모님도 결혼 안 하셨는데요."
▶외국 중에서도 프랑스는 동거 천국이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첫째 동거녀 세골렌 루아얄과 30년 넘게 살면서 자녀 넷을 낳았다.
올랑드가 한 여기자와 바람이 나면서 둘은 헤어졌다.
새 동거녀가 된 여기자는 올랑드와 함께 엘리제궁 입성의 기쁨을 누렸으나 그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7년 만에
짐을 쌌다. 올해 예순넷인 올랑드는 여전히 법적으로 '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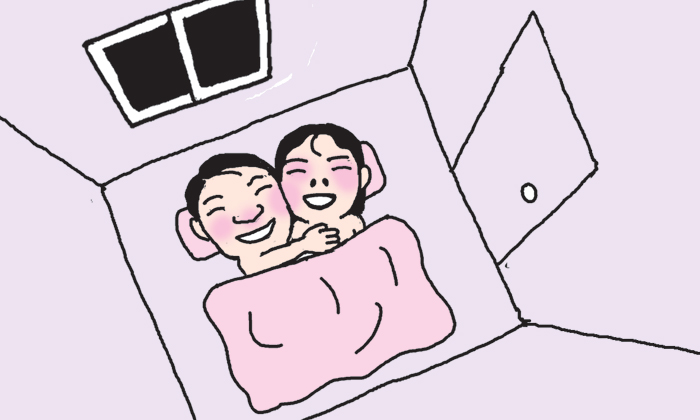
▶프랑스에서 법적 커플은 결혼한 부부, 단순 동거, 팍스 커플로 나뉜다.
팍스(PACS)란 '시민 연대 계약'이란 뜻의 'Pacte civil de Solidarité'를 줄인 말로, 이 계약을 맺은 커플은 배우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결혼한 부부와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누린다. 이 나라에서 동거나 팍스 커플은 정식 부부가
되려는 준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족 형태다. 국가 통계도 셋을 따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도 미혼 남녀의 동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많아졌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해보니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56.4%로 절반을 넘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8.1%였다. 이 비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20~30년 전만 해도 동거는 결혼 허락을 못 받은 자식들의 불효(不孝) 또는 심각한 사회적 일탈로 여겨졌다. 언젠가부터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식의 인생관이 등장하더니 이제 '결혼·동거·비혼(非婚) 중 선택한다'로 바뀌고 있다.
▶동거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면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1999년 동거 커플과 미혼모를 법률로 인정한 뒤로 1.65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이 유럽 최고치인
1.96으로 올라갔다. 작년 프랑스의 신생아 10명 중 6명은 결혼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1.9%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에서 동거관 변화의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전통적 가족관을 해치고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영화에서나 봤던 동거 풍경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상화될지 모른다.
'時事論壇 > 橫設竪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자 칼럼] 11월11일 11시 (0) | 2018.11.11 |
|---|---|
| [여의춘추-배병우] 북한발 성장동력은 없다 (0) | 2018.11.10 |
| [분수대] 칼레츠키와 장하성 (0) | 2018.11.07 |
| <오후여담>태양광의 함정 (0) | 2018.11.06 |
| [만파식적] 창덕궁 희정당 (0) | 201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