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평 / 논설위원
조선 선비들은 수선화를 귀히 여겼다. 연행(燕行) 사신 일행이 가져온 구근을 어렵게 얻어선 정성껏 키우며 완상했다. 당시로선 호사에 가까운 취미였다. 추사 김정희(1786∼1856)도 젊은 시절 부친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수선화의 매력에 빠진 뒤 평생 시화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윽하고 담담한 기품이 냉철하고도 빼어나다’고 상찬했다. 수선화 뿌리를 손에 넣자 남양주에 거주하던 다산 정약용에게 고려청자 화분과 함께 보냈다는 얘기도 전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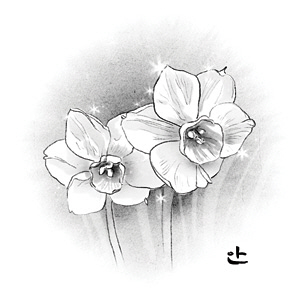
추사가 55세에 제주로 유배를 가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는다. 유배지인 대정(大靜)에 도착해보니 지천으로 널린 게 수선화 아닌가. 추사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주 사람들은 수선화가 귀한 줄 몰라 소와 말에게 먹이고 함부로 짓밟아버린다’고 탄식했다. 현지인들에게 수선화는 밭작물에 애물단지처럼 끼어드는 잡초였을 뿐이다.
수선화의 속명 나르키소스(Narcissus)는 연못에 비친 제 얼굴에 반해 빠져 죽은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한다. ‘울지마라/외로우니까 사람이다’로 유명한 정호승의 시 제목도 ‘수선화에게’다. 자의식과 고독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다. 수선화는 날렵하게 수직으로 뻗은 몸매가 건란(建蘭)을 닮았다. 줄기 사이에 난 꽃대 위로 네댓 송이가 달린다. 유백색 꽃잎 안으로 여러 개의 노란 잎이 섞여 있는데, 특히 둥근 잔 모양이 들어선 것을 ‘금잔옥대’로 부른다. 제주에서 구경할 수 있는 수선화는 거의 금잔옥대다. 50만 송이를 자랑하는 한림공원의 수선화도 그렇다.
제주 토속어로 ‘몰마농’이라고 하는 야생 수선화는 산방산이 바라보이는 제주 서남쪽 일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바로 추사가 거닐었던 유배지 부근이다. 들길, 해안길, 골목길 어디를 다녀도 수선화 무리가 눈에 들어온다. 초록 몸통에 희고 노란 꽃을 단 수선화와 제주 특유의 검은 농토·돌담이 만들어내는 색채 대비는 강렬하다.
흔히 봄의 전령사로 매화를 꼽지만, 제주에선 수선화가 먼저 핀다. 이르면 12월부터 3월까지 꽃을 볼 수 있다. 눈 속에 핀다 해서 ‘설중화(雪中花)’로도 불린다. 32년 만의 큰 눈으로 제주도는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는 재앙을 겪었다. 그 폭설과 혹한 속에서도 제주도는 수선화 향기로 가득하다고 한다. 어느새 2월이다. 매서운 한파 너머로 저만치서 봄이 오고 있다.
'人文,社會科學 > 日常 ·健康'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혜민의 월드why] '세뱃돈'에 울고 웃고..韓·中 차이 보니 (0) | 2016.02.04 |
|---|---|
| 65세 이상 10명 중 3명 우울 증세.. 말벗만 있어도 개선 (0) | 2016.02.03 |
| 직장인이 의미있게 휴일 보내는 법 7가지 (0) | 2016.02.01 |
| [이규연의 ‘미래 오디세이’①] "30년만 기다려라, 평균 ‘백세인생’ 온다” (0) | 2016.01.31 |
| 남성갱년기 증상, 성욕 줄고 근력과 지구력이 감소했다면 (0) | 2016.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