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9.07.02 송경모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앨런 크루거 '로커노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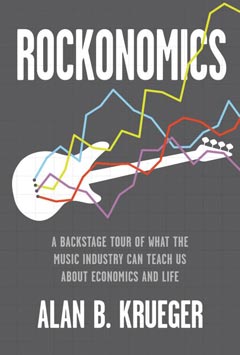 BTS 음악을 일부러 찾아 들을 것까지도 없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행사장,
BTS 음악을 일부러 찾아 들을 것까지도 없다. 커피숍, 레스토랑, 쇼핑센터, 행사장,
드라마, 영화,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가는 곳마다 음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산업은 규모 면에서 생각보다 작다.
2017년 미국 음악 산업의 총수입은 183억달러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GDP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16년 미국 전체 노동자 가운데 0.13%인 21만명 정도가
'가수, 음악인, 또는 관련 노동자'로 분류됐다. 미국인들은 평균 하루 3~4시간 정도
재생 음악을 들으며, 하루에 1인당 평균 10센트꼴로 지출이 일어난다.
지난 3월 타계한 전 오바마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유작 '로커노믹스(Rockonomics)'는,
소비자들이 대개 감상의 대상으로만 접하고 있는 음악 활동을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경제 원리의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냈다. 극심한 수급 변동과 불확실성, 혁신과 창조적
파괴, 개방과 협업, 승자독식과 소득 양극화 등 경제학의 거의 모든 주제가 등장한다.
미국 시장에서 라이브 공연은 대개, 사업 비용을 차감한 순수입의 15~20%를
매니저가 먼저 수취하고, 나머지를 밴드 구성원들이 나눈다.
스트리밍, 라이선싱, CD음반 판매 등 재생 수입은 아티스트가 전체 수입의 13~14% 정도만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이
이루어진다. 대중의 우상인 스타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은 생각보다 작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패 가능성과 시장 불확실성이
크고 이를 부담하는 경영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에서 최상위 소득을 올린 29인의 수퍼스타는 1인당 1950만달러를
벌었다. 하지만 이것도 대기업 최고경영자, 헤지펀드 운용자, 스타 운동선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경제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런 양극화의 원인은 음악 상품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도달할 수 있는 거대한 규모와 개별 상품의
대체 불가능성 때문이다. 과거 라디오나 TV, 비닐 음반 또는 CD로 음악을 소비했던 시절에 비해, 스트리밍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 덕분에 규모는 급팽창했고, 여기에 네트워크 효과와 멱승 법칙(power law)이 가세하면서 승자독식이 강화됐다.
이런 와중에 대부분의 음악인들은 생존 수준에도 미칠까 말까 한 소득만으로 버티고 있다.
빌리 조엘(Billy Joel)은 젊은 음악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타가 되겠다는 생각은 접어라.
음악인으로서 집세를 내고 생필품을 살 정도의 수입만 얻을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人文,社會科學 > 책·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논설실의 서가]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심리학 (0) | 2019.07.04 |
|---|---|
| [논설실의 서가] 가장 재밌는 드라마는 역사다 (0) | 2019.07.03 |
| [박소령의 올댓비즈니스] 발뮤다 창업자 "역전 기회는 늘 있다" (0) | 2019.06.30 |
| [다시 읽는 명저] "기업의 성패, 지식근로자에 달렸다" (0) | 2019.06.29 |
| [라이프 칼럼-김다은 소설가·추계예술대 교수] 읽어도 좋지만 읽지 않아도 (0) | 2019.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