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시 폭포에 흘러내린 물은 하늘빛이고 폭포수 안마를 즐기는 청춘들의 피부는 뽀얀 우윳빛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6.03.20 00:01
 루앙프라방은 아침이 좋다. 굳이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나 새벽시장이 아니더라도 뒷골목을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밤늦도록 마시고 떠들어대던 이방인들이 깊은 잠에 밀려나 있을 때 루앙프라방의 수줍은 삶은 그제야 얼굴을 내민다.
루앙프라방은 아침이 좋다. 굳이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나 새벽시장이 아니더라도 뒷골목을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밤늦도록 마시고 떠들어대던 이방인들이 깊은 잠에 밀려나 있을 때 루앙프라방의 수줍은 삶은 그제야 얼굴을 내민다.
승려들은 빗속에 발우를 메고 맨발로 나서고, 사람들은 좁은 처마 밑에 무릎을 조아린다. 새벽 탁발은 루앙프라방에서 매일 해뜰 무렵 진행되는 경건한 불교 의식이다. 주민들은 손으로 한줌 떼어낸 찹쌀밥 ‘카오냐오’를 스님들의 발우에 정성스럽게 담고, 이방인들이 들고 온 바게트나, 과자봉지도 허물없이 뒤섞인다.
 탁발로 시작된 루앙프라방의 아침 풍경은 골목 깊숙이 스며든다. 빛바랜 담벼락 너머에서 닭이 쉰 목소리로 울어대는 것도 정겹다. 장작을 때 피어올린 연기 사이로 식당이 문을 열고, 바구니가 달려 있던 컬러풀한 자전거 대신 검정색의 투박한 삶의 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지른다.
탁발로 시작된 루앙프라방의 아침 풍경은 골목 깊숙이 스며든다. 빛바랜 담벼락 너머에서 닭이 쉰 목소리로 울어대는 것도 정겹다. 장작을 때 피어올린 연기 사이로 식당이 문을 열고, 바구니가 달려 있던 컬러풀한 자전거 대신 검정색의 투박한 삶의 자전거가 도로를 가로지른다.
고깔모자를 쓴 여인이 쓰레기를 실은 세바퀴 툭툭을 타고 지나고, 가게 앞에서 커다란 눈망울의 아이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다. 슬라이드 넘기듯 차곡차곡 드러나는 루앙프라방의 아침은 이렇듯 완연하게 그들만의 소유다.
이때쯤 되면 낮에 익숙했던 풍경들이 오히려 어색하다. 촘촘히 들어선 게스트하우스와 빨래 1kg에 8000낍(약 1000원)을 받는다는 간이 세탁소들, 이방인들의 아지트인 시사방봉 거리의 품격을 높여줬던 작은 갤러리마저 낯설어 보인다. ‘욕망이 멈춘 땅’, ‘오랜 호흡이 담긴 도시’… 호사스런 수식어들만큼이나 배낭여행자들에게 루앙프라방은 더딘 이미지로 다가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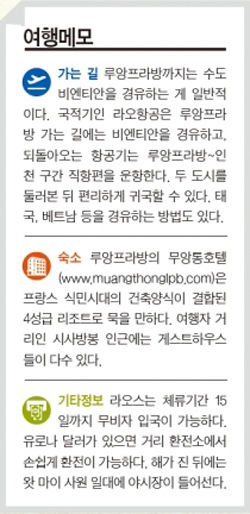 도심 한가운데 솟은 푸시 산의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루앙프라방은 붉은 지붕과 사원들이 엇갈리고, 메콩 강이 단아하게 에돌아 흐르는 산속 소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 일대에 80여 개 사원에 천 여 명의 스님들이 계시다는데, 사원들은 웅대하거나 오랜 세월의 퇴색한 모습이 아니다. 길목 한편에, 삶의 한 단면처럼 황금빛 담벼락은 들어서 있다.
도심 한가운데 솟은 푸시 산의 돌계단을 따라 오르면 루앙프라방은 붉은 지붕과 사원들이 엇갈리고, 메콩 강이 단아하게 에돌아 흐르는 산속 소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 일대에 80여 개 사원에 천 여 명의 스님들이 계시다는데, 사원들은 웅대하거나 오랜 세월의 퇴색한 모습이 아니다. 길목 한편에, 삶의 한 단면처럼 황금빛 담벼락은 들어서 있다.
식민세력이던 프랑스에 의해 새롭게 단장됐다는 왓 마이 사원의 지붕 끝자락에는 장터 천막이 함께 내걸리고, 옛 왕실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유서 깊은 왓 씨엥통 사원은 메콩 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변에 소담스럽게 앉아 있다.
골목에서 마주치는 호객행위는 대부분 ‘쾅시 폭포’로의 유혹이다. 40℃를 육박하는 뙤약볕 아래 루앙프라방의 낭인들이 다들 어디갔나 했더니 쾅시 폭포에 와 있다.
이 폭포에 흘러내린 물은 하늘빛이고 폭포수 안마를 즐기는 청춘들의 피부는 뽀얀 우윳빛이다. 비키니를 입고 활보하는 여인들, 줄을 타고 웅덩이로 뛰어드는 근육남들, 계곡에 몸을 담그고 책을 읽는 모습들이 또 다른 태평성대다. 단언컨대, 루앙프라방에서 쾅시 폭포는 제법 훌륭한 액세서리다.
가난이 아닌 느긋한 삶
 메콩 강을 거슬러 4000여 불상으로 채워진 팍우 동굴까지의 탐방 역시 이채로운 마을들이 어우러진다.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마을, 베틀로 라오스 전통 천을 짜는 마을, 전통주를 만드는 마을 등은 각각의 테마와 변질된 일상을 지닌 채 길가에 도열한다.
메콩 강을 거슬러 4000여 불상으로 채워진 팍우 동굴까지의 탐방 역시 이채로운 마을들이 어우러진다.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드는 마을, 베틀로 라오스 전통 천을 짜는 마을, 전통주를 만드는 마을 등은 각각의 테마와 변질된 일상을 지닌 채 길가에 도열한다.
루앙프라방에 문화적 향취가 강렬했다면 방비엥(Vang Vieng)에는 라오스의 자연이 담긴다. 옛 수도인 루앙프라방과 현 수도인 비엔티안이 10시간 남짓 연결되는 길목에 방비엥은 위치했다.
쏭 강이 에워싸고 흐르는 마을은 루앙프라방 이전에 배낭여행자들의 성지였다. 방비엥의 인상들은 비로소 황금빛 사원들로부터 자유롭다. 게스트하우스 평상에만 앉아 있어도 수려한 산세와 강물이 차곡차곡 겹친다.
‘노는 게 좋다’는 라오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가난보다는 느긋함으로 치장되기를 바란다. 한 달 평균 임금 수준이 10만원 정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이곳을 찾는 이방인들의 나라보다 높다고 하니 우리네 셈법은 큰 의미가 없다.
루앙프라방(라오스)=글·사진 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느림의 미학이 깃든 땅이다. 사람도, 탈 것들도 더딘 템포로 오간다. 욕망이 멈춘 곳, 힐링의 도시, 뉴욕 타임즈 선정 죽기 전 가봐야 할 여행지 1위…. 다양한 수식어만큼이나 외지인들에게 루앙프라방은 여유롭고 단아한 이미지로 다가선다.
라오스 북쪽의 루앙프라방은 란싼 왕조의 첫 번째 수도다. 산으로 둘러싸인 해발 700미터의 도시는 불교사원과 유럽 식민 시대의 빛바랜 건물을 간직한 채 오랫동안 웅크려 있었다. 그런 고립과 단절은 루앙프라방의 앳된 모습을 지켜냈다. 도시 전체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1. 해발 700미터에 자리잡은 힐링의 도시 루앙프라방 전경. 2. 식민세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시사방봉 거리.
승려들은 빗속에 발우를 메고 맨발로 나서고, 사람들은 좁은 처마 밑에 무릎을 조아린다. 새벽 탁발은 루앙프라방에서 매일 해뜰 무렵 진행되는 경건한 불교 의식이다. 주민들은 손으로 한줌 떼어낸 찹쌀밥 ‘카오냐오’를 스님들의 발우에 정성스럽게 담고, 이방인들이 들고 온 바게트나, 과자봉지도 허물없이 뒤섞인다.

1. ‘신성한 언덕’ 푸시산 숲 속 사원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누워있는 부처님. 2. 루앙프라방의 아침을 깨우는 승려들의 탁발행렬. 3. 게스트하우스에는 세계문화유산을 찾는 이방인들로 차고 넘친다.
고깔모자를 쓴 여인이 쓰레기를 실은 세바퀴 툭툭을 타고 지나고, 가게 앞에서 커다란 눈망울의 아이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는다. 슬라이드 넘기듯 차곡차곡 드러나는 루앙프라방의 아침은 이렇듯 완연하게 그들만의 소유다.
이때쯤 되면 낮에 익숙했던 풍경들이 오히려 어색하다. 촘촘히 들어선 게스트하우스와 빨래 1kg에 8000낍(약 1000원)을 받는다는 간이 세탁소들, 이방인들의 아지트인 시사방봉 거리의 품격을 높여줬던 작은 갤러리마저 낯설어 보인다. ‘욕망이 멈춘 땅’, ‘오랜 호흡이 담긴 도시’… 호사스런 수식어들만큼이나 배낭여행자들에게 루앙프라방은 더딘 이미지로 다가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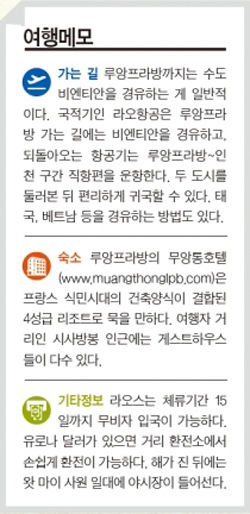
식민세력이던 프랑스에 의해 새롭게 단장됐다는 왓 마이 사원의 지붕 끝자락에는 장터 천막이 함께 내걸리고, 옛 왕실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유서 깊은 왓 씨엥통 사원은 메콩 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변에 소담스럽게 앉아 있다.
골목에서 마주치는 호객행위는 대부분 ‘쾅시 폭포’로의 유혹이다. 40℃를 육박하는 뙤약볕 아래 루앙프라방의 낭인들이 다들 어디갔나 했더니 쾅시 폭포에 와 있다.
이 폭포에 흘러내린 물은 하늘빛이고 폭포수 안마를 즐기는 청춘들의 피부는 뽀얀 우윳빛이다. 비키니를 입고 활보하는 여인들, 줄을 타고 웅덩이로 뛰어드는 근육남들, 계곡에 몸을 담그고 책을 읽는 모습들이 또 다른 태평성대다. 단언컨대, 루앙프라방에서 쾅시 폭포는 제법 훌륭한 액세서리다.
가난이 아닌 느긋한 삶

‘노는게 좋다’는 라오스 사람들은 느긋한 삶이 배어있다.
루앙프라방에 문화적 향취가 강렬했다면 방비엥(Vang Vieng)에는 라오스의 자연이 담긴다. 옛 수도인 루앙프라방과 현 수도인 비엔티안이 10시간 남짓 연결되는 길목에 방비엥은 위치했다.
쏭 강이 에워싸고 흐르는 마을은 루앙프라방 이전에 배낭여행자들의 성지였다. 방비엥의 인상들은 비로소 황금빛 사원들로부터 자유롭다. 게스트하우스 평상에만 앉아 있어도 수려한 산세와 강물이 차곡차곡 겹친다.
‘노는 게 좋다’는 라오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가난보다는 느긋함으로 치장되기를 바란다. 한 달 평균 임금 수준이 10만원 정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이곳을 찾는 이방인들의 나라보다 높다고 하니 우리네 셈법은 큰 의미가 없다.
루앙프라방(라오스)=글·사진 서영진(여행칼럼니스트)
'記行·탐방·名畵 > 기행·여행.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뚝섬 개나리, 여의도 벚꽃, 반포 유채..한강 꽃축제 58일 릴레이 (0) | 2016.03.26 |
|---|---|
| [한강 다리 야경 'ON'] 5월부터 한남·영동·잠실대교 등 경관조명 켜는 교량 18개로 늘려 (0) | 2016.03.23 |
| 당신의 버킷리스트였던 해외 관광지들의 실체 (0) | 2016.03.19 |
| [서울시, 꽃놀이 명소 156곳 선정] 벚꽃 터널 '워커힐길' 드라이브에 최고 (0) | 2016.03.18 |
| [커버스토리] 온통 붉게 화장해 눈부시네, 사철 푸른옷 입어 싱그럽네 (0) | 2016.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