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06.29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미국이나 영국의 빵집에 가면 '빵 장수의 한 타스(baker's dozen)'라는 패키지가 있다.
12개가 아니라 13개들이 포장을 말한다. 왜 빵집의 한 타스는 13개인가?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은 이렇다.
주식(主食)인 빵은 생필품 중의 생필품이다.
고대(古代)로부터 양을 속여 팔지 못하도록 공급자를 규제했고 위반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양을 속이다 적발되면 손목을 자른다는 벌칙까지 있었다.
하지만 도량형과 화폐가 혼란스러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세 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폐·도량형을 정비하면서 밀가루의 가격을 화폐 단위에 연동시킨다.
즉 '투입된 밀가루=생산된 빵=고정 가격'으로 공식을 일원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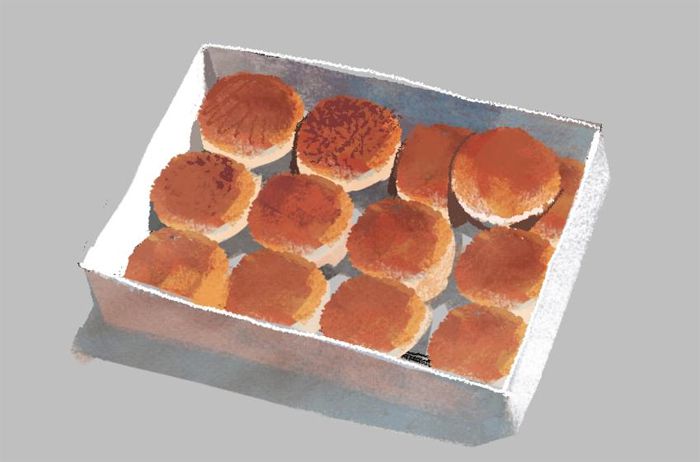
당시 빵은 타스로 팔았는데, 빵의 무게가 지불한 돈에 비해 부족하다고 당국에 고발당하면 판매자는 치도곤을
당할 수 있었다. 빵은 무게를 딱 맞춰 생산하기 어렵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정량에 미달할 수도 있다.
이에 빵 장수들은 12개가 아니라 13개를 한 타스 묶음으로 팔기 시작한다.
조금 아끼려다 큰 벌을 받는 것보다 덜 남기더라도 안전하게 장사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명확한 규정은 정직한 공급자에게도 득이 된다. 밀가루·빵·화폐를 연동시켜 계산을 단순화하는 조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덕 업자보다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양심 업자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이처럼 불확실성·모호성의 감소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신뢰에 기초한 시장 참여의 동기를 부여한다.
반대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규제와 그에 근거한 시장 간섭은 거래 비용을 증가시킨다.
많은 경우 '단순하고 명확한 규제'가 '공평하고 철저하게 이행'되는 것만으로 시장은 원활하게 작동한다.
만든 사람도 헷갈릴 정도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을 만들고는 시장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우(愚)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규제권자는 항상 경계하면 좋을 것이다.
'人文,社會科學 > 敎養·提言.思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삶의 향기] 죽음에 대하여 (0) | 2018.07.08 |
|---|---|
| [내가 만난 名문장]'싸구려 은혜'의 세상 (0) | 2018.07.03 |
| [이정모 칼럼] 사랑이 이긴다 (0) | 2018.06.27 |
| [삶의 향기] 느리게 읽고 힘겹게 쓰기의 아름다움 (0) | 2018.06.24 |
| [삶의 향기] 매력 <魅力> (0) | 2018.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