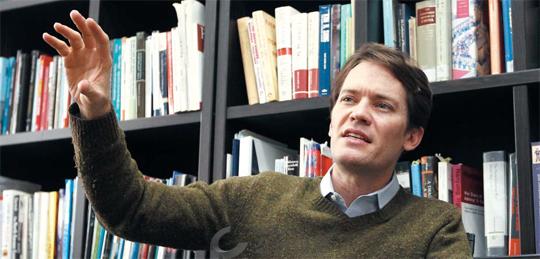(출처-조선일보 2015.01.31 이한수 기자)

'독립적 자아' '상호의존적 자아'의 갈등,
인종·계층·종교 등 문화적 편견 불러
다른 자아 인정하고 배려해야 공존 가능
우리는 왜 충돌하는가
헤이즐 로즈 마커스 · 엘래나 코너 지음
박세연 옮김|흐름출판|464쪽|1만9000원 미국 대학에서 아시아계 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다.
스탠퍼드대 문화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국 유학생 희정은 어느 날 토론식 수업에서
교수로부터 짜증 섞인 비난을 들었다.
"가만히 앉아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아시아 학생들은 혼자서
사고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희정은 발끈했다. 주말에 수준 높은 리포트를 쓰고 나서 한 줄 덧붙였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미국인 교수와 한국 학생의 작은 갈등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충돌일
수 있다. 희정은 '왜 미국인들은 교실 속 침묵에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가'를 연구 주제로
삼았다.
비언어 지능검사인 '레이븐 검사'를 통해 미국인들은 말하면서 문제를 풀 때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계 학생들은 조용히 문제를 풀 때 더 높은 점수를 낸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렇다면 '침묵은 생각이 없는 것'이라는 미국인 교수의 주장은 문화적 편견에 불과하다.
스탠퍼드대 교수와 같은 대학 박사 출신인 두 저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충돌을 분석한다. 동·서양과 남녀, 인종과 계층, 지역과 종교, 기업·정부와
남·북반구(半球) 등 8가지 문화적 충돌이 대상이다.
저자들이 본 갈등의 원인은 단순하다. 사람이란 두 가지 유형의 자아가 있으며
서로 다른 두 자아가 부딪칠 때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후
지난 7일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후 - 프랑스 시민들이 ‘나는 샤를리다’라고 쓴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아래 사진은 알제리 무슬림들이 ‘나는 무함마드다’라는 종이를 든 모습.
- /AP 뉴시스·뉴시스
두 유형은 '독립적 자아'와 '상호 의존적 자아'다. 앞서 미국인 교수는 개인의 자존감을 중시하는 서양 문화의 맥락 속에 있다.
개인은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 학생은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종교 갈등도 두 자아의 충돌로 해석이 가능하다. 2005년 덴마크 신문 '율랜츠포스텐'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폭탄 모양 터번을 두르고 길게 줄을 선 자살 폭탄
테러범들에게 "그만해! 이젠 처녀들이 다 떨어졌어!"라고 외치는 만평을 실었다.
이 일로 여러 나라 덴마크 대사관이 공격을 받고 100여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일어난 샤를리 에브도 사건 같은 보복 테러였다.
'독립적 자아'를 주장하는 서구 독자들이 볼 때 그 만화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무함마드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이슬람권에서 볼 때 이는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를 모욕하는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누군가의 명예를 더럽히면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나서는 이슬람 문화에서 보복에 기꺼이 동참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저자들은 "진보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려면 우리 모두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평범한 절충론 또는 양비론(兩非論)이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 자아와 상호 의존적 자아가 모두 필요하며, 다문화 사회의 공존을 위해
서로 다른 자아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결론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일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후
지난 7일 무함마드 만평을 실은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