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01.27 홍승기 배우·인하대 로스쿨 교수)
베이징에 가서 우리말만 했다. 중국 변호사들과, 중국 교수들과도 한국말로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들이 실무 수습 중인 로펌에 들러 인사를 하고 교류협정을 맺었다.
중국은 1995년경부터 국가고시를 통해 정규 변호사를 배출한다. 20년 남짓한 짧은 변호사 제도에도 불구하고
시내 금융가에 자리 잡은 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 1000명의 대형 로펌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40대 초반의 대표 변호사와,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석·박사를 했다는 유학파 변호사들이 우리 일행을 맞았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TLBU)을 졸업했다는 중견 변호사도 아는 체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국제법률경영대학원은 아시아 각국 청년을 선발해 영어로만 수업하는 독특한 교육기관이다.
점심 자리에 마주 앉은 여성 변호사는 대학생 때 한류에 빠져 졸업 후 북경의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유학 기회를
잡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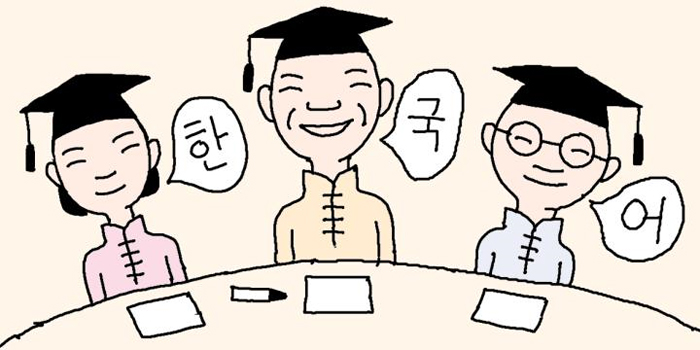
중국정법대학 한국법연구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했다.
명색이 '국제 세미나'에서 우리말로 발표하고 토론하기는 처음이었다.
중국 측 참석자 중에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 되어 발음이 힘들다며 동료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질문하는 이도 있었으나
대부분 우리말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 그들이 유학한 우리나라 대학이며 지도 교수를 따지다 보니 다들 이렇게 저렇게
친구가 되었다. 한국법연구센터 책임자는 우리나라 학계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차고 있었다.
중국의 지식사회는 특유의 융통성과 복원력으로 문화혁명의 상처를 극복하고 껑충껑충 앞을 향해 달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구원들에게 제시하는 인센티브도 깜짝 놀랄 수준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첨단 자본주의를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
외국어 부담을 덜었다는 생각에 흥겹게 비행기에 올랐으나 베이징에서의 우리말이 막상 편하지만은 않았다.
군사력, 경제력, 학문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행하는 대국의 높이뛰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人文,社會科學 > 日常 ·健康'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운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과학적 이유 (0) | 2017.01.29 |
|---|---|
| [오드아이] 남편들이여, 접시를 깨자 (0) | 2017.01.28 |
| [사노라면] 겨울의 힘 인간의 힘 (0) | 2017.01.23 |
| [일사일언] 이인화를 생각한다 (0) | 2017.01.22 |
| 한 달간 내집처럼..제주 등 '단기임대' 급팽창 (0) | 2017.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