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7.12.24. 14:15
옛날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세상이 온통 모서리가 둥근 무채색으로 변해간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실컷 울고 난 뒤 기분 같아서,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하나 둘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다. 과연 땅에 가 닿을 수 있을지 싶은, 가만한 움직임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폭설은 눈이 내릴 것 같은 기미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임을. 오지 않는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전봇대 아래 버려진 택배 상자가 눈에 젖어 짙은 갈색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지켜본다.
오래 전 경기도 어느 외진 산속 마을에 살 때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어느 날 사정이 생겨, 차로 2,30분 거리에 있는 학생 집으로 내가 직접 가야만 했다. 늦은 오후부터 하늘은 잔뜩 흐렸고, 폭설이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도 있었다. 그래도 아직 내리지 않는 눈 때문에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 눈보다는,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이 저녁 시간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이른 저녁을 먹이고 아들이 즐겨보는 만화가 시작될 무렵 TV를 틀어 주고 집에서 나왔다. 그날만은 만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학생 집에 도착할 무렵 오는 둥 마는 둥 눈발이 가볍게 흩날렸다. 일기예보에서는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눈이 내릴 것이라 했으므로, 미리 걱정하지 않았다. 두 시간쯤 뒤에 밖으로 나와 보니, 함박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눈은 이미 발목까지 쌓인 상태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여 집으로 향했다. 눈이 아니더라도 오가는 차들이 거의 없는 도로였다. 눈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가로등도 없고 집도 없는 허허 벌판이라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논과 밭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 갓길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차를 세웠다. 하얀 눈이 뭉텅뭉텅 쏟아지는 하얀 세상이 끝없이 이어져 있을 뿐이었다. 집에 혼자 있는 아들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대로 눈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주술처럼 쏟아지는 눈발 속에서 언젠가 똑 같은 말을 중얼거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만큼 내가 어렸을 때였다. 날이 어두워진 것도 모르고 친구 집에서 놀다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네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것 말고도 뭔가 이상했다. 아침까지도 공사 중이라 가려져 있던 차단막이 걷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보여야 할 풍경이 보이지 않았다. 여름마다 앵두나무 덤불을 헤치고 내려가 가재를 잡던 개천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넓고 밋밋한 낯선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개천을 덮고 새로 낸 도로였다.
저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길, 한 발을 내딛으면 자칫 사라진 개천 속으로 푹 꺼져 버릴 것 같은 길. 나는 용기를 내서 눈발이 휘날리는 하얀 길로 들어섰다. 희뿌옇게 빛나는 어둠을 헤치고 걸어가는 내내 어린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중에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까. 오랜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고 또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 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마침내 시간의 어지럽고 긴 터널을 빠져 나온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있다. 기억처럼 고요히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버려진 택배 상자를 적시던 차가운 눈송이들이 구겨지고 찢어진 상자 위로 하얗게 쌓여가는 순간, 이미 약속시간을 놓친 내 앞에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던 마을버스가 눈발을 헤치고 나타나는 순간.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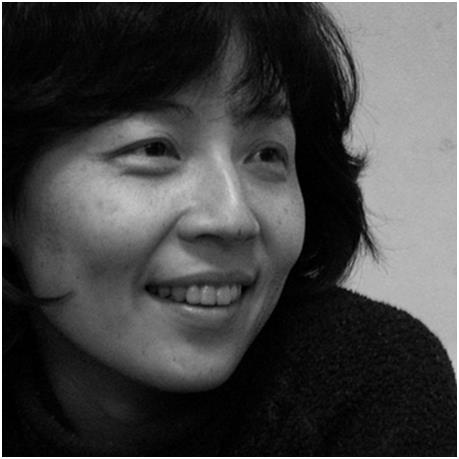
'人文,社會科學 > 敎養·提言.思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가 만난 名문장]내일은,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은 새날 (0) | 2017.12.31 |
|---|---|
| [아침을 열며]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기에 (0) | 2017.12.30 |
| [일사일언] '오지선다'와 나만의 관점 (0) | 2017.12.25 |
| [삶과 문화] 행복의 조건 (0) | 2017.12.23 |
|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4] 나만의 깃발이 펄럭이는 삶 (0) | 201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