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0.03.18 김규나 소설가)
미래에 대해 겸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국화꽃은 시들고'라는 노래가 싸구려 카페에서 금이 간 앰프를 통해 아무리 나쁜 음질로 흘러나온다 해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 저편에서는 청중이 말없이 그의 현악 사중주에 감동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멀지 않은 훗날, 두 청중이 겹쳐지고 뒤섞이게 될지도 모른다. -줄리언 반스 '시대의 소음' 중에서. |
얼마 전 어머니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었다. 젊은 사람이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친구분들 사이에서도 인기 최고라고 했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트로트 대회 참가자였을 것이다.
그 후에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서 우승 후보자들의 노래를 몇 곡 찾아 들었다.
'가요무대'에서나 들을 법한 곡들을 젊은 세대가 구성지게 부르는 게 신기했다.
그런데 궁금하다. 왜 지금, 트로트일까?
영국 작가 줄리언 반스가 2006년에 발표한 '시대의 소음'은 스탈린 치하에서 작곡가로 활동했던 쇼스타코비치의
내면 갈등을 그린다. 대중을 선동하고 권력을 비호하는 데 이용당하면서도 그가 바란 건 음악을 하는 것,
음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다. 언제 비밀경찰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작품만은 살아남길 원했다.
클래식이든 그의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대중가요든 미래의 언젠가는 모든 음악이 자유롭게 연주되고
불릴 수 있기를 꿈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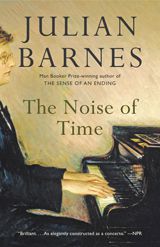 '시대의 소음'
'시대의 소음'
트로트는 아무리 밝게 불러도 한(恨)과 설움이 내재된 노래다.
코로나다, 마스크 5부제다, 경기 침체다 해서 마음 둘 데 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트로트의
직설적인 가사들이 화살처럼 날아가 꽂혔을 것이다.
무엇보다 힘들게 살아왔다는 젊은 도전자들을 응원하며 시청자는 시대의 소음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트로트 열풍은 복고 예찬이다.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가 암울한 까닭에 과거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대중 심리의 반영이다.
축제가 끝나고 우승자가 결정되었단다. 성원했던 사람이 이겼다면 기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패배한 듯 허탈하기도 한가 보다. 엄마가 응원한 건 누구였을까. 전화해봐야겠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8/2020031800053.html
'人文,社會科學 > 作品속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비클릭] 인비저블맨 | 투명인간을 대하는 공포·경멸 생생 (0) | 2020.03.22 |
|---|---|
| [무비클릭] 작은 아씨들 | 따뜻한 가족 이야기에 녹여낸 여성주의 (0) | 2020.03.20 |
|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5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완성 (0) | 2020.03.11 |
|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49]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버린 이 땅의 청춘들 (0) | 2020.03.04 |
| 빼앗길 수 없는 자유[내가 만난 名문장] (0) |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