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6.04.29 김기철 문화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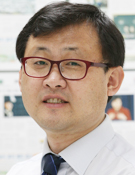 16세기 피렌체의 지식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오늘날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참고할 만한
16세기 피렌체의 지식인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오늘날까지 정치 지도자들이 참고할 만한 교과서로 통한다.
하지만 정치 참여를 지식인의 의무로 생각했던 동아시아엔 마키아벨리 못잖은 '정치 교과서'가
수두룩하다. 17세기 명말청초(明末淸初) 격동기를 살았던 황종희(黃宗羲·1610~1695)의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도 그중 하나다.
고염무(顧炎武), 왕부지(王夫之)와 함께 당시 3대 지식인으로 꼽혔던 황종희는 열아홉 살에
고염무(顧炎武), 왕부지(王夫之)와 함께 당시 3대 지식인으로 꼽혔던 황종희는 열아홉 살에
시련을 겪었다. 아버지가 당대 권력자인 환관 위충현을 탄핵하다 옥사(獄死)했기 때문이다.
명나라 말기의 실정(失政)과 잇단 전란, 만주족의 침입을 겪으면서 황종희는 청(淸)에 저항하는
무장투쟁을 조직했고, 일본까지 건너가 명나라를 위한 구원병을 요청할 만큼 행동파 지식인이었다.
하지만 청나라의 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귀향해 숨질 때까지 벼슬하지 않고 학문에 몰두했다.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중년의 그가 1663년 개혁의 열망을 담아 쓴 책이 '명이대방록'이다.
'군주론'에서 '신하론'으로 이어지는 이 책의 첫 대목은 절대군주 체제 아래 살았던 유교 지식인이 썼으리라곤
'군주론'에서 '신하론'으로 이어지는 이 책의 첫 대목은 절대군주 체제 아래 살았던 유교 지식인이 썼으리라곤
믿기지 않는 장면이 수두룩하다.
'내가 나가서 벼슬하는 것은 천하(天下)를 위한 것이지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며, 만민(萬民)을 위한 것이지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공자님 말씀이라고? 다음은 어떤가.
'군주가 자기를 위하여 죽고 자기를 위하여 망할 때에 내가 그를 따라서 죽고 망한다면 그것은 사사로운 총애를 받는
자가 하는 것이다.' 황종희는 군주의 뜻을 무작정 추종하는 것은 환관이나 궁녀나 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인다.
신하는 군주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군주 또한 신하의 맹목적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황종희는 말한다. '나에게 천하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나는 군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군주를 섬길 때 천하 백성을
위한 것으로 일을 삼지 않으면 군주의 노비(奴婢)이고, 천하를 위한 것으로 일을 삼으면 군주의 사우(師友)이다.'
수백년 전 중국 지식인의 글을 떠올린 이유는 우리 정치판 때문이다.
수백년 전 중국 지식인의 글을 떠올린 이유는 우리 정치판 때문이다.
친박(親朴)도 모자라, 진박(眞朴)까지 내세운 여당의 어처구니없는 4·13 총선 마케팅에 국민은 심판의 표를 던졌건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친박, 비박 싸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하(天下), 요즘 말로 국정(國政)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전략의 차이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친소(親疏) 관계에 따라
정파가 나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념이나 정책에서 도긴개긴 한 몸인데, "저놈은 안 된다"며 '뺄셈의 정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배신의 정치'라는 날 선 단어를 내세우며 정치판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과 신의의 경쟁으로 줄 세운 데 대한 반성도
'배신의 정치'라는 날 선 단어를 내세우며 정치판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과 신의의 경쟁으로 줄 세운 데 대한 반성도
여전히 없다. 한국 정치를 수백년 전 왕조시대에조차 비판거리가 됐던 사적(私的) 충성의 장(場)으로 되돌려놓고도
이렇다 할 성찰이 없다는 건 놀랍다. 국민을 '주머니 속 사유물'처럼 얕보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00년 전 군주를 하늘로 떠받들던 시대에 살았던 황종희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이 지경인 걸 보면, 어리둥절해 말문이 막힐 것 같다.
'人文,社會科學 > 책·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Bools 400자평]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한 독립운동가 30명의 列傳.외 2권 (0) | 2016.05.01 |
|---|---|
| [당신의 리스트] 피아니스트·지휘자 김대진의 예술하는 제자들에게 권하는 책 5 (0) | 2016.04.30 |
| [세상물정의 사회학] 세속이라는 리얼리티를 향한 사회학자의 사회학 (0) | 2016.04.25 |
| [당신의 리스트] 소설가 이인화의 세상 모든 스토리 중의 스토리 5 (0) | 2016.04.23 |
| [고전이야기] 神들 전쟁에 낀 인간,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다 (0) | 201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