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5.02.03 김승준·성우)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입을 여는 순간 호감도가 뚝 떨어질 때가 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입을 여는 순간 호감도가 뚝 떨어질 때가 있다. 반면 비호감이었던 사람도 정작 만나 얘기를 나눠보면 목소리나 말투가 친근해 인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음성(音聲)이란 게 참 묘하다. 그 음성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성우다.
미디어는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
미디어는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
시각이 모든 감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성우라니, 요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직업 같다.
하지만 우리 생활 이곳저곳에 아주 밀접하게 관여한다. 가전제품 내 음성 서비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내음, 게임이며 TV 속 소리 대부분에 성우가 있다.
성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더빙'이다.
성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더빙'이다.
어릴 적 TV로 외국 영화를 보며 "우와, 외국인인데 한국어 진짜 잘하네" 하며 탄복하곤 했다.
그 영화를 보며 먼 타국의 세상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게 한국 성우가 목소리를 입힌 결과물임을 알게 된 건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지만,
그 외화와 함께한 내 유년의 추억은 오해에 머물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더빙을 단순 '한국말 번역'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흡수를 돕는 완충 장치라 생각하는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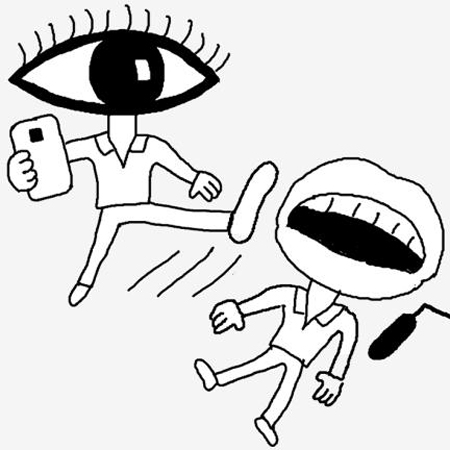 지난해 추석 즈음 할리우드 영화
지난해 추석 즈음 할리우드 영화
'노예 12년'을 더빙한 적이 있다.
노예를 향해 쏟아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송용' 대사가
난무하는 영화였다.
사실 성우들도 감정에 몰입해 연기하다 보면 약속된 대본이
있는데도 비속어를 구사할 때가 있다. 감정이 격해져 실수로
비속어를 내뱉으면 녹음장은 웃음바다가 된다.
대부분 욕은 (아쉽긴 하지만) 암묵적 약속의 비속어 "제길"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완성된 영화 한 편이 방송을 탄다.
앞 못 보는 이들도, 화면 하단의 조그마한 자막이 불편한
이들도 이 목소리를 통해 문화를 향유한다.
그렇게 45년간 안방을 지켜왔던 KBS '명화극장'이 끝내
사라졌다. 그래도 끝끝내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다.
"늘 좋은 연기를 해줘 고맙다"는 한 지체장애인의
블로그 쪽지 같은 것이다.
시각의 시대, 내가 계속 성우로 살아가는 이유다.
'時事論壇 > 橫設竪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사일언] '길바닥' 전시장 (0) | 2015.02.05 |
|---|---|
| [분수대] 우리 ‘각자내기’ 합시다 (0) | 2015.02.04 |
| [일사일언] 스펙 대신 스펙트럼 (0) | 2015.02.02 |
| 마눌의 잔소리가 점점 공포로 다가온다 (0) | 2015.02.01 |
| [일사일언] 심장에 남는 사람 (0) | 201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