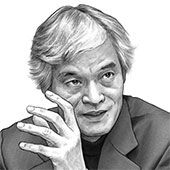
송호근 서울대 교수 · 사회학
37년 전 10월 26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유고방송의 슬픈 목소리는 청명한 가을 아침과 어울려 추상화처럼 번졌다. 멍한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다. 우상화된 이념에서 풀려난 낯선 시간이었다. 이성은 곧 현기증을 물리쳤다. 멀게만 보였던 민주주의의 깃발이 눈앞에서 펄럭였으므로 극심한 혼란도, 쿠데타 소문도 일종의 축제 북소리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10·26과는 달리 딸의 10·26은 느닷없는 비기(秘記)의 습격이다. 멀쩡한 논리로는 결코 이해 불가한 심령의 세계, 계룡산 두마천 상류 무속촌에 가야 설명 가능한 드라마, 아니면 영화 ‘곡성’의 음침한 세계? 아버지의 10·26은 ‘우상과 이성’의 접전이었다면 딸의 10·26은 오랜 비설(秘說)과 접신한 듯한 민주주의의 오염이다.
정녕 아니길 바라지만, 가수면 상태의 상상력이 자꾸 그 세계로 끌고 간다. 거길 가면 박자가 잘 맞는다. 아리송했던 퍼즐이 척척 들어맞는다. 그토록 고집한 ‘올림머리’는 어머니의 육화, 깃 올린 슈트형 재킷은 아버지 분장이었을까.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가 ‘3년간 133종 옷’을 입었다고 공격했는데, 필자는 칼럼에서 3종 패션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그런데 모두 군복의 변형인 슈트형 재킷이고, ‘빨주노초파남보’와 흰색 일색이라면 바이칼호에서 연원돼 한반도로 내려오는 샤먼의 형상이 국가 지도자에게 옮겨붙었을까? 부질없는 상상이 꼬리를 문다. 모신(母神)을 얹힌 부친의 유업을 국정과제로 잇는 본부가 청와대, 지부가 문체부였나? K한류, K한식, K스포츠 등 K자는 ‘민족 중흥’ ‘한국적 민주주의’를 열망한 부친의 혼(魂)을 모시는 신위(神位)였을지 모른다. 적어도 무의식의 공간에서는 말이다. ‘늘품체조’가 나오고, 동상과 기념공원이 다시 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