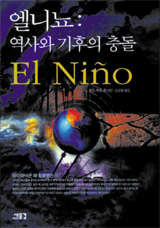천천히 생각하는 12가지 방법 제시

슬로씽킹
칼 오너리 지음|박웅희 옮김|쌤앤파커스
411쪽|1만5000원
411쪽|1만5000원
제약회사들은 '즉시 치료된다'는 약속을 판다. 정치도 다이어트도 그렇다. "내년까지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말보다는 "한 달 안에 고칠 수 있다"는 말이 더 달콤하다. '서두름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성직자도 피해 갈 수 없는 중독이다. 오스트리아의 마르틴 슐라크 몬시뇰은 이 책에서 고백한다. "최근에 나도 기도를 너무 빨리하고 있어요."
영국 저널리스트 칼 오너리는 전작 '느린 것이 아름답다'에서 현대사회의 속도 숭배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책은 속편과 같다. 비즈니스, 정치, 교육, 환경, 인간관계, 건강 등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임시변통의 해결책 '퀵픽스(quick fix)'를 버리고 정반대 '슬로픽스(slow fix)'로 나아가야 한다며 12가지 방법을 일러준다. 핵심은 '슬로씽킹', 즉 '천천히 생각하기'다.
우리는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빨리 먹고, 빨리 사랑하고, 빨리 생각한다. "현대는 효과 빠른 요가와 1분 잠자리 동화의 시대"라고 오너리는 진단한다. 클릭이나 터치 한 번으로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계에 길든 사람들은 세상만사가 소프트웨어의 속도로 흘러가기를 기대한다. 미국 교회는 차에 탄 채로 진행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장례식을 실험하고 있다. 바티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고백으로는 대속(代贖)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될 때 퀵픽스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2005년 미국 텍사스에 있던 브리티시 페트롤륨(BP)의 정유공장이 폭발했다. 이듬해에는 알래스카 해안의 BP 송유관에서 두 차례 기름이 유출됐다. 최고경영자가 "이번엔 땜질 처방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2010년 BP의 석유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에서 폭발이 일어나 11명이 사망했고 기름이 유출돼 환경 재앙으로 이어졌다.
영국 저널리스트 칼 오너리는 전작 '느린 것이 아름답다'에서 현대사회의 속도 숭배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책은 속편과 같다. 비즈니스, 정치, 교육, 환경, 인간관계, 건강 등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임시변통의 해결책 '퀵픽스(quick fix)'를 버리고 정반대 '슬로픽스(slow fix)'로 나아가야 한다며 12가지 방법을 일러준다. 핵심은 '슬로씽킹', 즉 '천천히 생각하기'다.
우리는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빨리 먹고, 빨리 사랑하고, 빨리 생각한다. "현대는 효과 빠른 요가와 1분 잠자리 동화의 시대"라고 오너리는 진단한다. 클릭이나 터치 한 번으로 작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계에 길든 사람들은 세상만사가 소프트웨어의 속도로 흘러가기를 기대한다. 미국 교회는 차에 탄 채로 진행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장례식을 실험하고 있다. 바티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고백으로는 대속(代贖)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될 때 퀵픽스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2005년 미국 텍사스에 있던 브리티시 페트롤륨(BP)의 정유공장이 폭발했다. 이듬해에는 알래스카 해안의 BP 송유관에서 두 차례 기름이 유출됐다. 최고경영자가 "이번엔 땜질 처방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2010년 BP의 석유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에서 폭발이 일어나 11명이 사망했고 기름이 유출돼 환경 재앙으로 이어졌다.

 getty image/멀티비츠
getty image/멀티비츠
이 책은 영국 공군, 노르웨이 교도소, 도미노피자, 페덱스 등이 '슬로씽킹'으로 난제를 푼 사례를 소개한다. 천천히 생각하기는 과오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들은 점들을 연결해 전체를 보는 접근법을 택했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면서 서로 협력했다. 창의성은 무엇보다 잠복기가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부글부글 솟아오르기까지 문제 속에 잠길 시간 말이다. "모든 일에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가장 어려운 길이 장기적으로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이라는 문장이 뻐근하다.
빠른 것이 더 낫다는 통념에 저항하는 '슬로 무브먼트'는 달팽이처럼 살자는 게 아니다. 모든 일을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이 걸맞은 속도(최상의 결과를 내는 속도)로 하는 것이다. 인내심 교육은 서두름 바이러스를 막는 예방접종이 될 수 있다.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진단과 처방에는 수긍한다. "내가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지 문제들을 더 오래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밑줄을 쫙 그었다. (박돈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