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조선일보 2016.06.18 어수웅 기자)
돈·책·패션·사랑 등 주제별로 북유럽의 생활문화사 풀어내
"현대의 모든 것 시작된 곳" 주장
왕권·지배층 아닌 개인의 歷史… 한국 북유럽 열풍의 뿌리 엿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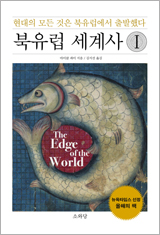 북유럽 세계사(전2권)
북유럽 세계사(전2권)
마이클 파이 지음|김지선 옮김|소와당
312, 284쪽|각권 1만8000원
실용으로 이름난 가구와 생활 소품 '이케아', 덴마크 왕의 이름을 빌려온 '블루투스',
스마트폰을 장악한 게임 '앵그리버드', 그리고 아이슬란드를 행선지로 삼은 '꽃보다 청춘'까지.
가히 북유럽 르네상스다. 지구 반대편인 우리에게까지 스며든 북유럽의 문화·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과연 우연이 누적된 결과일까.
'북유럽 세계사'를 쓴 영국의 위트 있는 역사 저술가 마이클 파이(70)는
"그럴 리 없지 않으냐"고 웃는다.
2014년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꼽힌 이 매혹적인 세계사는 "현대의 모든 것은 북유럽에서 출발했다"고까지 의욕을 보인다.
내세우는 이유가 역설적이다.
"북유럽 사람들은 세계를 장악할 의도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다."
제국에의 욕망도, 종교적 권위도 부재했던 지구의 땅끝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먹고 사는 것일 뿐.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나 하고, 어디라도 간다.
명분은 너희가 가져라, 실리는 우리가 챙길 테니!
지금까지 세계사의 무대 전면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변방의 역사다.
단테의 '신곡'에서 저승을 안내하는 베르길리우스처럼 이 '불한당 작가'는 우리를 커튼 뒤 세계로 인도한다.
|
'북유럽 세계사'의 첫 번째 매력은 흡인력 강한 스토리텔링 역사서라는 것.
어깨에 힘준 중후 장대형 연대기와 달리 주제별로 가장 극적인 부분을 먼저 내세우며 이야기를 푼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역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파이의 유머 넘치는 필력 덕이다.
"세실 워버튼은 온천에서 신사들이 하는 일을 했다. 매일 5파인트(약 2.8L)의 물을 마셨다.
잉크 냄새에 신맛이 나는 유명한 물. 그 물을 마시면 쾌변을 볼 수 있었다…"
워버튼이 선택한 곳은 1733년의 스카버러. 북해를 사이에 두고 덴마크와 마주 보는 잉글랜드 중북부 해변 도시다.
무역과 전쟁의 중요한 무대였던 북유럽 수로(水路) 네트워크의 핵심 도시.
워버튼은 귀족이었지만 이런 '중요한' 일에 관심이 없었다고 작가는 적었다.
그리고 평범한 귀족이 누이에게 쓴 편지를 인용한다.
"살이 하나도 안 빠진 것 같아…"
현미경과 망원경을 번갈아 쓰며 작가가 찾아내는 역사는 중심이 아닌 주변, 강자가 아닌 약자, 왕권과 지배층이 아닌
평범한 개인의 생활문화사다. 따라서 일상이라는 렌즈를 낀 주제별 서술이 두 번째 매력이 된다.
돈·책·바이킹·정착·패션·법·자연·과학·상인·사랑·흑사병·도시가 그 주제어.
패션을 주제로 한 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프랑스의 왕비 잔 달브레(1528~1572)가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 브뤼허와 헨트 여성들을 보고 비단과 보석 때문에
화를 냈던 일화는 유명하다. '여왕이 나 하나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여왕이 수백 명은 되는 모양이군.'"
가슴의 각도나 치마의 길이는 남프랑스의 궁정이 아니라 북유럽의 저잣거리에서 재고 있었다는 파이의 주장은
'파리의 살림살이'(1393) 등 늘 각종 자료로 뒷받침된다.

법과 도덕을 지켜야 하는 공식적 인간이 아니라 돈과 섹스 등 유혹에 취약한 현실의 인간에게 주목하는 이 책의 관심은
'사랑과 결혼'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2권 10장의 한 구절. "1180년대 아이슬란드의 어느 교도소 유물에 섹스 토이가 남아 있다.
성직자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몸을 더럽힌 죄가 여인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다."
브뤼허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라는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1453년 브뤼허에 머물던 스페인 사람 페로타푸르는 이런 기록을 남겼다.
"남녀가 함께 교회 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듯이 브뤼허 사람들은 남녀 혼욕을 정당한 일로 여겼다."
12세기 렌느 지역의 어느 가톨릭 주교는 '자궁에 스피어민트를 쓰면 여성이 임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가톨릭에서 부부간의 피임은 죄악. 섹스의 목적은 쾌락이 아니라 수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충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혼외정사는 물론 부부간에도 피임이 이뤄졌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물론 파이가 섹스와 패션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호박이나 비단이 아니라 종이로 된 차용증과 신용장을 들고 거래했던 1500년대 안트베르펜의 증권거래소와
주식회사 등 근대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었던 현장에도 실제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찾아간다.
이 책이 말하는 북유럽의 중심은 북해.
그리고 이 추운 바다를 둘러싼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스코틀랜드·아일랜드·잉글랜드다.
기존의 세계사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변두리의 땅.
파이는 "북해의 회색빛 차가운 바다 언저리에서 낡고 하찮고 뒤떨어진 것들이 현대의 우리 모습을 만들었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나쁜 모습으로"라고 했다.
이제 그들의 몫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것이므로 더욱 더.
원제 'The Edge of the World: A Cultural History of North Sea and the Transformation of Europe'.
'人文,社會科學 > 책·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을 읽읍시다 (500)] 보수의 공모자들 (0) | 2016.06.21 |
|---|---|
| [당신의 리스트] 서양사학자 박진빈 경희대 교수… 美 대선 구도 이해에 도움되는 책5 (0) | 2016.06.19 |
| [태평로] 망각과 싸우는 기억의 戰士들 (0) | 2016.06.17 |
|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나'를 소중하게 여겨라 (0) | 2016.06.15 |
| 나치 독일을 방조한 유럽인 풍자와 反轉 (0) | 2016.0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