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7.07.17 송경모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조너선 맥밀런 'The End of Banking'
 조너선 맥밀런
조너선 맥밀런
익숙했던 것들이 서서히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은행 제도라고 해서 예외일까?
유럽의 투자은행 종사자와 거시경제학자 2인이 2014년 쓴 '은행의 종말(The End of
Banking·국내 미번역본)'은 상업은행, 투자은행을 포함한 종래의 은행(banking) 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이 조너선 맥밀런(Jonathan McMillan)이라는
가명을 쓴 이유는 아마 뱅킹 현업 최전선에 종사하면서 은행 제도를 비판하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꺼려했기
때문인 듯하다. 실무 경험에서 나온 통찰, 정통 화폐금융 이론과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산업화 이후 금융 위기의 진원지는 대부분 은행 부문이었다.
그때마다 경제는 숨통이 막혔고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그 절정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권화된 시장경제를 지탱해야 할 은행 제도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느끼지 못했다. 정부가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까지 더했다.
예금자보호법과 바젤협약(Basel Accord)은 물론이고 온갖 시시콜콜한 금융 규제는 다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처럼 은행이 법망을 회피하면서 더 많은 위험 투자를 감행하도록 하는 결과만 낳았다.
이 와중에도 예금자들은 여전히 은행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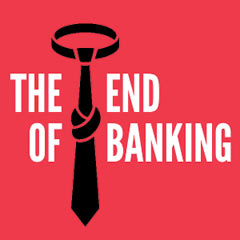 그렇다고 은행 종사자(뱅커)들을 자유방임으로 놔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고 은행 종사자(뱅커)들을 자유방임으로 놔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럴 경우 실물경제는 은행 종사자들의 돈놀이에 휘둘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폐와 신용의 움직임을 최상위에서 조직화함으로써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감시와 견제,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저자는 본질을 묻는다. 은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실물경제 순환을 위해 지불 수단을 원활히 창출해주는 것이 아닌가?
산업화 시대에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은 통화량, 즉 지불 수단의 총량을
그렇게 증가시킴으로써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을 분명히 촉진했다.
하지만 지금 은행 종사자들은 본연의 사업 목적은 잊은 채 정부의 보호 속에 안주하면서도 호시탐탐 규제를 회피하며
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괴물로 전락했다. 이런 제도는 21세기에 도대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저자는 최근 등장한 P2P 금융과 핀테크를, 이 거대한 혁신을 이룩할 동력으로 주목한다.
지불준비금, 공개시장 조작, 신용평가회사의 뒷북, 금융 당국의 권력 집중, 서민 금융의 높은 문턱 등도
서서히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알차면서도 군더더기가 없는 책이다.
무엇이 진정한 금융 혁신인가? 이와 관련해 무릎을 치게 하는 통찰이 곳곳에 숨어 있다.
'人文,社會科學 > 책·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대식의 북스토리] 《로지코믹스》-러셀의 수학탐구 과정을 논리와 만화로 유쾌하게 풀어내다 (0) | 2017.07.18 |
|---|---|
| [북카페] 인간의 위대한 여정 외 (0) | 2017.07.17 |
| "생일 선물로 책을 줘?… 거, 나쁜 친구네" (0) | 2017.07.16 |
| 2017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추천도서 100선' (0) | 2017.07.16 |
| [박소령의 올댓 비즈니스] 갱생·성장의 56년… 스티브 잡스에게 바친다 (0) | 2017.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