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8.01.23. 01:52
문재인 정권이라도 피해 가려면
전차 포신을 전방으로 향하고
목표물도 사람보다 제도에 맞춰야

게다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는 일은 어느 정권도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대한 법정 심리는 여태 진행형이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새로운 죄목이 부가되면서 법정에 끌려다니는 박근혜의 모습이 처연하다 못해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킨 지 오래다. 조속히 매듭지었으면 하는 대중심리가 확산 중이다. 이런 마당에 전전(前前) 정권을 둘러싼 단죄 논란이 지금 시작된다면 아마 내년 여름이 돼야 겨우 결말을 지을 것이다. 정권의 절반이 전직 대통령들의 적폐청산에 소요되는 셈이다.
두 명의 통치자를 모조리 단죄하면 개혁동력을 얻을까? 미래로 가는 길이 닦일까? 김영삼 정권 때는 문민정부라는 역사적 명분에 걸맞았고, ‘학살’과 ‘수천억원 수뢰’라는 천인공노할 죄목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다. 오히려 박수갈채로 화답할 정도였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정권은 개혁동력을 얻었다. 승전가를 울렸다. 독재청산은 한국 정치의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 내부단속에 실패했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비하지 못했다. YS 정권은 아들 김현철의 국정개입과 외환위기로 무너졌다. 국민이 감내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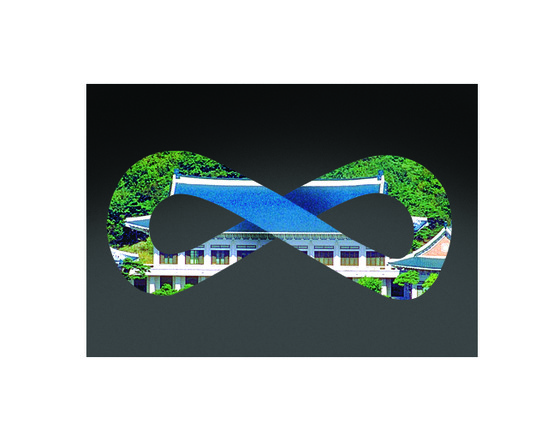
9년 전 칼럼에서 필자는 이렇게 썼다. “그 생명공양(生命供養)의 대가로 우리는 한국 정치를 직조하는 ‘운명의 형식’에 대해 눈을 번쩍 떴다”고. “차별 없는 세상과 도덕정치를 꿈꿨던 통치자가 내몰렸던 마지막 벼랑, 그 벼랑에서 맞닥뜨렸던 운명이 또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그를 묻고 돌아선 다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고(중앙일보, 2009년 6월 1일). 그 운명의 악순환을 어쨌든 끝내야 한다.
복수의 화신이라면 조선시대 정조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정조는 즉위식에 도열한 조정대신들에게 고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노론 벽파는 공포감에 떨었다. 그런데 그들을 등용했다. 노론, 소론, 남인 간의 알력을 교묘히 활용했다. 정조는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았다. 오직 협치를 위한 자제였다. 정조의 어찰첩에 의하면, 노론 벽파는 ‘주둥아리를 놀려대는 호로자식들’이었다. 정조는 적폐청산을 처벌보다는 제도개혁으로 실행했다. 남인 채제공을 발탁해 육의전 특권을 철폐하고 사상(私商)을 육성했다. 수원에 신흥세력을 길러 경제체질을 바꾸려 했다. 제도적 복수전이었다.
민주화 시대에 출현한 다섯 차례의 정권은 초기 의욕과 시퍼런 서슬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번쩍이는 강철판을 몸체에 휘두른 ‘권력이란 이름의 전차(戰車)’가 마냥 초원을 질주할 줄 알았지만, 3년 차에 접어들면 힘이 빠지고, 결국 녹슨 전차가 되어 산기슭에 처박혔다. 반대세력의 강력한 거부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했다. 적폐로 몰아붙이는데 도와줄 리 없었다. 업적 빈곤으로 개혁동력을 쇄신하지 못했고, 정책실패를 만회할 실행능력이 고갈됐다. 그러자 내부 분열이 발생했다.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걸려든 ‘쇠락의 덫’을 문재인 정권만은 기어이 피해 가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전차의 포신은 전방을 향해야 하고, 목표물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여야 한다. 제도 혁파가 아닌 사람 혁파가 전공인 정권은 5년 뒤 등장할 신형 전차의 사냥감이다. 척사(斥邪)의 명분이 수시로 뒤바뀌는 그 악순환의 대가를 결국 국민이 치렀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其他 > 송호근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호근 칼럼] 평창과 다보스 (0) | 2018.02.21 |
|---|---|
| [송호근 칼럼] 핵(核) 파는 처녀 (0) | 2018.02.07 |
| [송호근의 퍼스펙티브] 개헌, 시민이 나설 때다 (0) | 2018.01.12 |
| [송호근 칼럼] 개띠 해, 장인의 꿈 (0) | 2018.01.10 |
| [송호근 칼럼] 눈물 젖은 편지 (0) |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