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경/논설주간
총선 이후 대통령은 노동·금융·교육·공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집권세력의 행태다. 낙천·낙선자들이 공기업을 접수할 판이다. 전체 340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관은 97개, 감사·사외이사 자리는 수백 개다. 지금 친박 완장을 찬 낙하산들은 청와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정신없이 꿀을 빨 태세를 속속 갖추고 있다. 이러고도 개혁이 잘되면 역사에 남을 기적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나라 밖에선 “한반도에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들려온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페리 프로세스’의 주역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이제는 코리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활이 걸린 당사자인 한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에선 국민을 안심시킬 어떤 그림도 보이지 않는다. 총선에서도 한반도 위기 관리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슈에서 밀려났다. 5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군 장성들이 불량 무기를 사들여 배를 불리다 줄지어 교도소에 가는 장면이 낯설지 않은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국인이 심리적으로 고립된 ‘섬나라’ 사람인 때문이 아닐까. 눈부신 성취 뒤에 감춰진 패배주의와 기회주의가 주범인데 뿌리가 너무도 깊다. 518년을 버틴 조선 왕조의 몰락이 민주적 공화정이 아닌 식민 통치를 불러온 순간 우리의 운명은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식민지·분단·전쟁·냉전·독재의 격랑 속에 집단적 감시의 대상이 됐고 ‘나만 살고 보자’는 저급한 생존논리가 지배했다.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엄은 설 자리를 잃었고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면서 책임 있게 사유하고 행동하는 명예로운 시민의 지위는 사치가 됐다. 시민 없는 한국은 자폐(自閉)의 사회다. 내면의 양심에도 눈감고 외부의 정보와 자극에도 무감각하다. 이렇게 해서 ‘국민’은 스스로 만든 노예제에 묶였다. 공공의 영역에선 통제받지 않는 정치인의 탐욕이 제멋대로 춤춘다. 근(近) 백년사의 비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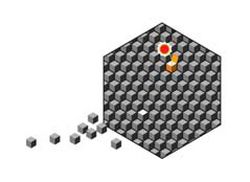
생물학자인 토머스 실리 코넬대 교수는 꿀벌 무리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발견했다. 꿀벌들은 정찰대를 조직해 복수의 후보지를 찾아낸 뒤 8자 춤으로 무리를 설득한다. 이런 소통과 경쟁의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최적의 집터를 결정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이주한다. 꿀벌 한 마리는 한정된 정보와 제한된 지능을 갖지만 집단은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여왕벌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물론 초개체인 꿀벌 집단과 달리 인간은 개별적인 자의식이 있어 개체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는 인정할 수 없다. 군림하는 지도자에 의존하지 않고 평범한 다수가 활발히 소통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4000만 년을 생존해온 꿀벌의 지혜가 부럽지 않은가.
식민지의 아들로 태어나 전근대에 갇혀 절망하면서 근대의 여명을 향해 직진한 시인 김수영은 이렇게 고백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이만 나왔다고 분개하고(중략)/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1960년대 김수영을 절망시켰던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50년이 흘렀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저 내 배만 불리고 내 마누라와 자식만 챙기는 욕망의 주체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 존엄성의 근거인 정의와 윤리를 나의 과제로 끌어안는 공공적 시민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섬나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어렵지만 결단하면 이 나라는 경쟁과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아비지옥에서 관용·연대·평등이 흘러넘치는 천국으로 개벽(開闢)할 기회를 맞을 것이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를 구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이하경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