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19.07.20 11:00
소득주도성장 강력히 비판한 송호근 교수
![제44회 제주포럼에서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낙엽이 지기 전에 고용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20/3e27f22c-b517-43d8-b378-d9cbcf5f5c41.jpg)
제44회 제주포럼에서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낙엽이 지기 전에 고용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20일 폐막한 제44회 제주포럼'은 예년에 비해 화끈한 설전과 치열한 논박으로 화제가 됐다. 뜨거웠던 주제 중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이었다.
제주포럼 한라홀에서 18일 강연자로 나선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는 “격문(檄文·널리 알려 부추기는 글)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예정된 시간을 20분 가량 넘기면서 열변을 토했다.
강연의 핵심은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내용이다. 그는 현재의 국가 경제 상황을 ▶성장동력란 ▶고용란 ▶무역란의 ‘3란(亂)’으로 규정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고용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사진 대한상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7/20/548e6544-1eab-42b0-a67d-42ef67a0f685.jpg)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고용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사진 대한상의]
송 교수는 국가 경제가 악화한 배경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도마에 올렸다.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다.
그는 2010년 대비 지난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65%)이 주요 5개국(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 대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소득 하위 20% 소득이 7.6% 감소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 소득은 10.3% 늘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파괴 특명 정책이자, 분배 악화 특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소득 성장·분배 악화의 배경은 결국 반시장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고용주를 쥐어짜고, 보조금을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반시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정책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시장적 방법으로 경제 성장 어려워
이번 포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규제’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중앙일보 경제1면
송 교수는 탈원전·비정규직정책·강사법 등을 거론하며 “지금까지 이런 규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본’과 ‘공급’을 규제하는 이른바 ‘이중 규제’가 고용 축소와 소득 불평등 악화를 유발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예컨대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전력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유발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고용시장에 부작용을 미쳤다.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강사 대량실업을 유발했다. 3가지 사안 모두 정책의 의도는 좋지만 각종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송 교수의 지적이다.
송 교수는 또 20대 국회가 제출한 법안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1만9185건)에서 규제법안이 3197건에 달하며, 이 법안이 규정한 규제조항이 5938개에 달한다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시장 경쟁을 규제하는 법안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주성 대안은 ‘고용주도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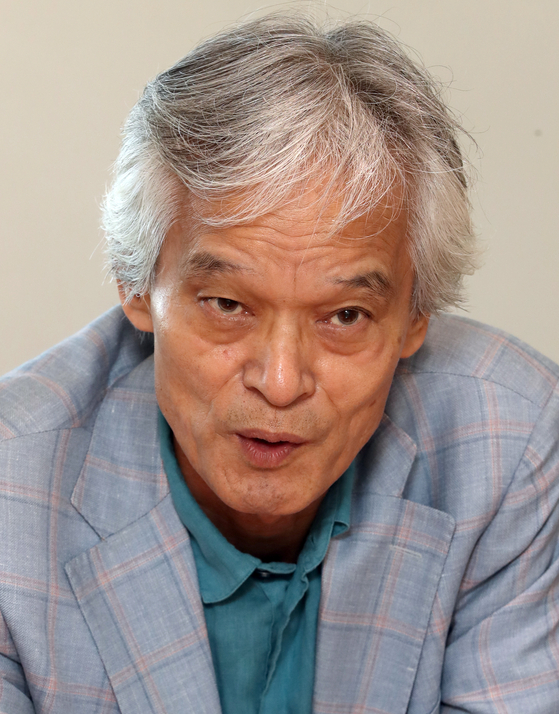
송호근 포스코 석좌교수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을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공정경제는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부문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지만, 부문별·업종별 차등적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고용주도성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적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요지다. 고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취업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자금을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주=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여기서 공정경제는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완만하게 조정하고 부문별·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지만, 부문별·업종별 차등적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 대신 고용주도성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의 정책을 적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요지다. 고용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취업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 자금을 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분배도 개선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주=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其他 > 송호근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호근 칼럼] 고향의 시간 (0) | 2019.09.17 |
|---|---|
| [송호근 칼럼] 한국사학자 카이텐 (0) | 2019.08.19 |
| [송호근 칼럼] 되살아나는 제국 (0) | 2019.07.09 |
| [송호근 칼럼] 최종병기, 그가 왔다 (0) | 2019.06.25 |
| [송호근 칼럼] 혁명세대의 독창 (0) |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