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8.01.11 전영규·문학평론가)
 전영규·문학평론가
전영규·문학평론가
어느 낭독회에 간 적이 있다. 건물주의 강제집행으로 한동안 장사를 접은 어느 가게에서 열렸는데,
시위 과정에서 가게 사장님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그 가게에서 열린 '현장잡지' 낭독회. 현장잡지는 낭독회가 열리면서 창간되고 끝남과 동시에 완간되는
형태의 잡지다.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으로 이뤄지기에 참가자들의 일은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게 전부다.
이런 행사가 한 달에 한 번, 8~9명의 작가와 참석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대로 된 물질로서의 책조차 없는 이 낭독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을 향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어느덧 작은 연대를 이루고 있었다.
낭독이라는 행위가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주진 않는다. 단지 위안과 공감이 될 뿐이다.
다만 그 위안과 공감에서 문제의식이 시작되고 그것을 모색해보자는 실천 의지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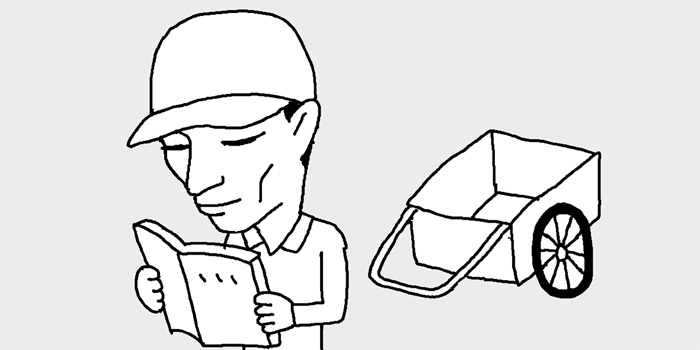
타인의 고통에 무심해지는 나를 발견할 때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종이 박스를 줍는 일로 먹고산다는 것은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일일까."
소설가 황정은의 장편 '백(百)의 그림자'에 나오는 말이다.
도대체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가혹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문학의 역할은 이런 게 아닐까.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각성을 요구하는 일.
더 나아가 고통받는 타인을 향한 위안과 공감을 불러내 보이지 않는 연대를 이루는 일.
소설가 박경리의 말이 생각난다.
"작가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작가의 본질, 인류의 운명을 고민하는 게 작가가 가는 길이다."
문학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해도,
문학을 업으로 삼는 자에겐 생존만큼이나 치열한 고뇌와 각성을 필요로 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별 볼일 없는 내 문장들이 나와 무관한 자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그 위안이 삶을 향한 연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人文,社會科學 > 敎養·提言.思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사일언] '여자 누드' 많은 이유 (0) | 2018.01.16 |
|---|---|
| [삶과 문화] 아내는 책, 남편은 공간 (0) | 2018.01.13 |
| [마음산책] 너도 나처럼 아팠구나 (0) | 2018.01.11 |
| [ESSAY] 선화공주와 한반도의 꿈 (0) | 2018.01.10 |
| [나리카와 아야의 서울 산책] 서울·교토·연변 하나로 이어준 윤동주 '서시'의 매력 (0) | 2018.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