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드럽게 유도하는 넛지가 아니라
팔을 세게 비튼 충격 요법
정치적 생색은 정권이 내고
자영업·중소기업이 선금 지불해
이 1000만 명이 내년 선거의 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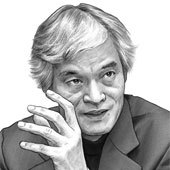
들어 보니 그럴 법도 했다. 매출액은 완만한 내리막인데 내년부터 인상되는 시급이 걱정이었다. 종업원 세 명을 그대로 유지하면 매월 100만 원, 연 1000만원가량이 더 든다. 4대 보험 부담도 더 늘어난다. 종업원들은 보험비를 아끼려고 고용신고를 회피한다. 실제로 지불되는 인건비가 영업비용에 잡히지 않기에 역으로 주인의 세금은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책을 쓴다는데요?”라는 반문에 주인은 쓴웃음을 날렸다. “그까짓 것, 새 발의 피죠.” 주인이 손수 몸으로 뛰는 것, 그게 대안이었다. “줄여야죠, 숯불도 내가 피우고.”
숯불 피우고 음식을 직접 나를 주인이 늘었다. 역으로 일급·시급 고용이 줄어든다는 건 상식이다. 춘천 시내 유명한 먹자골목, 1년 새 간판을 바꾼 집이 대여섯 곳이다. 겨우 버틴 식당 주인들이 모여 말한다. “저거 또 바꿀 텐데, 뭐한다고?” 혀를 끌끌 차지만 정작 자신들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 골목 부근에만 편의점이 여섯 곳이 들어섰다. 이슥한 저녁, 편의점 앞 파라솔에 술판이 벌어진다. 혼밥·혼술 손님을 뺏긴 지는 오래, 그것도 모자라 입가심 손님을 뺏겼다. 전국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편의점이라고 호황일까?
서초동 주택가·편의점 점주가 야간 노동을 하고 새벽에 퇴근한다. 낮 12시간은 알바에게 맡긴다. 목이 안 좋은 편의점엔 점주 부부가 18시간 일하고 6시간만 맡긴다. ‘주휴수당이 무서워서’다. 주휴(週休)수당? 근로기준법 55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자에게 고용주는 1일 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매일 여섯 시간씩 일하면 월 24시간, 15만6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 줄잡아 7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300만 명의 중소기업주에게 에누리 없이 적용된다. 종업원 세 명을 둔 식당이 내년부터 당장 지급할 추가비용은 약 1500만원 정도다. 편의점 점주가 말했다. “5년 안에는 접어야죠.” 5년 안에 접힐 점포가 수만 개 대기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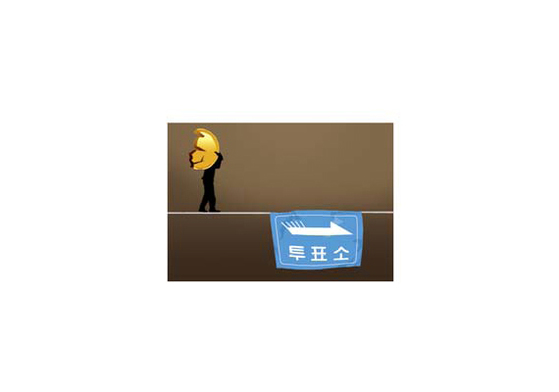
이게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R. Thaler) 교수가 말한 ‘보유 효과(endowment effect)’다.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더 민감하다. 내줄 돈 계산에 예민해진 고용주의 선택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뇌관을 여지없이 파괴한다. 시간제, 임시직에겐 당장 좋은 그림이겠으나 1000만 명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의 반격이 시작됐다. 정부가 정책 메뉴를 달리 배치했다면 어땠을까. 매출 늘리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렸다면 부작용은 좀 작지 않았을까.
특정 경제이론에 매달린 정부 정책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정한다. 경제행위자의 합리성은 경제적·심리적 득실계산에 포박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 틈에서 부정합이 발생한다. 행동경제학자 세일러가 넌지시 권고한다.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팔꿈치로 살짝만 건드려라(nudge)’, 부드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과도한 개입보다 백배 낫다고 말이다. 가령,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차선 폭을 좁게 그리면 운전자가 알아서 속도를 늦춘다. 경고판 수십 개보다 낫다. 하층민 소득증대에 올인한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은 넛지가 아니라 팔을 세게 비튼 충격 요법이다. 악 소리가 난다. 그런데 정작 비용을 대는 전주(錢主)는 하층 전락의 문턱에서 고투하는 중산층이다.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고용 기회 확대는 시의적절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다. 그러나 생색은 정권이 내고, 선금 지불은 중산층이 맡았다. 함바 식당이라면 모를까, 사람들은 후불제를 믿지 않는다. 중산층 내부 업종별 분쟁이 격화되고, 점주와 저소득층 종업원 간 밀고 당기는 대리전이 한창이다. 중산층의 대리전쟁, 신음소리가 진동한다. 내년 지방선거에 발사될 벙커 버스터다. 줄잡아 1000만 명이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其他 > 송호근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송호근의 퍼스펙티브] 한국호의 순항은 통치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0) | 2017.11.11 |
|---|---|
| [송호근 칼럼] 촛불과 자장면 (0) | 2017.10.31 |
| [송호근 칼럼] 통영 가는 길 (0) | 2017.10.04 |
| [송호근 칼럼] ‘배신의 정치’는 힘이 세다 (0) | 2017.09.20 |
| [송호근의 퍼스펙티브] 수소탄 태풍 앞 '빈손' 한국은 왜 이리 차분한가 (0) | 2017.09.15 |